강근숙 파주작가
두지나루의 황포돛배
두지나루에 매였던 황포돛배가 밧줄을 풀고 서서히 몸을 튼다. 햇살 좋은 날 나들이 나온 연인과 가족들은 해설을 들으며 강변을 바라보느라 호기심 가득하다. 분단 이후 반세기 동안 민간인 출입이 통제됐던 임진강에 원형 그대로 황포돛배를 복원하여 2004년 봄, 두지나루에서 고랑포 여울목까지 뱃길을 열었다.
조선 시대의 주요 운송 수단이었던 황포黃布돛배는 광목에 물을 들인 돛에 바람을 받아 동력으로 운행하던 우리나라 전통적인 평저선平底船이다. 지금은 엔진을 달아 선착장에서 자장리까지 6.5킬로 구간을 돌아오는 50여 분 동안 ‘임진팔경’의 하나인 적벽의 뱃놀이를 즐길 수 있다.
임진강은 한반도의 허리인 중부 내륙과 북부지방의 남단에 걸쳐있다. 함경도 마식령산맥의 두륜산에서 발원하여 강원도 북부를 흐르면서 연천에서 철원, 평강을 거쳐 흘러온 물은 한탄강과 합쳐진다. 파주의 동·서로 흘러가는 임진강은 오두산 부근에서 한강과 만나 서해로 흘러간다.
연천에서 파주 사이를 흐르는 물살을 따라 황포돛배가 떠내려간다. 강물은 깨끗한 2급수지만 바닥에 현무암이나 검은 모래가 깔려 물속이 시커멓게 보인다. 강물 위에는 어구를 표시해 놓은 각양각색의 플라스틱 용기가 둥둥 떠 있다.
옛날에는 ‘물 반 고기 반’이라는 말이 임진강에서 나왔을 정도로 어종도 많고 수확량도 풍부했다. 지금도 피라미, 빠가, 누치가 많이 잡히고 황복과 장어, 참게는 귀한 대접을 받는다. 강가에는 어부가 있게 마련이고 매운탕도 일품이다. 두지리 어부들은 오늘도 강이 주는 풍요를 낚는다. 뱃전에 강에서 잡은 준치를 매달고 그물을 당기는 조각배가 한 폭의 그림이다.
임진강변의 자연경관

임진강을 안고 줄줄이 이어지는 바위에는 이름도 사연도 많다. 절간바위, 자라바위, 빨래터 바위, 거북이가 서해를 향해 나오는 형상을 한 거북바위를 지나면 검붉은 적벽이 나타난다. 임진강의 생성은 약 2억 년 전 서로 떨어져 있던 두 개의 대륙이 충돌하여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다.
60만 년 전에 형성된 현무암 지대에 임진강이 흘러 침식 현상으로 만들어진 수직 절벽은 크고 작은 돌기들이 거대한 책꽂이 형태로 펼쳐졌고, 아래쪽은 마치 시루떡을 잘라 놓은 듯 돌이 포개져 있다. 한반도의 자연사를 여실히 보여주는 적벽 사이로 희귀식물인 돌단풍이 하얗게 피어있다.
돌단풍은 적벽 돌 틈에 뿌리를 박고 산다. 이른 봄, 화사하게 꽃을 피우고 퇴색할 무렵 꽃보다 싱그러운 진초록 잎으로 적벽을 감싼다. 그리고 가을에는 잎사귀가 붉게 물들어 뱃놀이하는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편한 자리 마다하고 굳이 깎아지른 절벽에 꽃을 피우는 돌단풍은 아무리 봐도 대쪽 같은 선비의 고고함을 닮았다. 엊그제 내린 비로 물이 불어 적벽 가까이서 적벽과 돌단풍을 자세히 볼 수가 있었다.
선비의 풍류가 깃든 정자들
태평세월 선비들은 임진강가에 정자를 짓고 풍류를 즐겼다. 조선 시대 파주에는 20여 개가 넘는 정자가 있었다는데, 지금은 화석정과 반구정 두 정자만 남아있다. 율곡栗谷 이이李珥가 시와 학문을 논하던 화석정花石亭과 방촌庬村 황희黃喜가 갈매기를 벗 삼아 시를 짓고 정담을 나누던 반구정伴鷗亭에는 많은 역사가 담겨있다.
검붉은 ‘자장리 적벽’은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의 대가인 겸재謙齋 정선鄭敾의 ‘임진적벽도’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260년 전에 나귀를 타고와 뱃놀이를 즐기며 적벽을 화폭에 담았을 선비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조금 내려가면 화선지를 펼쳐놓은 듯 넓적한 절벽이 보인다. 절벽에는 조선 중기 문신이자 전서篆書의 대가인 미수眉叟 허목許穆이 쓴 괘암卦巖이라 글씨가 새겨져 있다는데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육안으로는 보이질 않는다.
반구정 정자에는 미수 허목이 지은 반구정기가 걸려있다. ‘정자는 파주에서 서쪽으로 시오리 지점에 있는 임진강 하류에 위치하였다. 매일 조수가 나가고 뭍이 드러나면 하얀 갈매기떼가 날아드는데 주위가 너무 편편하여 광야도 백사장도 분간할 수 없다. 구월쯤이면 철새들이 첫선을 보이기 시작하고, 서쪽으로는 바다의 입구까지 이십 리가량 된다.’고 당시 정자 주변의 풍광을 묘사해 놓았다. 연천에서 태어난 허목선생은 황포돛배를 타고 임진강을 오르내리며 흥에 겨워 절벽에 글씨도 쓰고 반구정 정자에 앉아 글을 지었으리라.
번성했던 고랑포의 흔적
자장리 적벽과 맞은편 원당리 적벽이 대문을 활짝 열어 놓은 듯하다. 강폭이 좁아지면서 물줄기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저곳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임진강 상류로는 마지막 포구였던 고랑포 지점이다. 뭍과 바다의 산물이 모이는 집산지였던 고랑포구는 6·25동란 전만 해도 인구도 문산, 파주보다 3배나 많았고, 화신백화점 분점이 있었을 정도로 번성했던 곳이다. 그때의 흑백사진을 보면 초가로 ㄴ,ㄷ자 형태의 집들이 촘촘하고 면사무소, 병원, 여관, 소시장, 곡물검사소와 우체국, 문방구 등이 있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폐허로 만든다. 고랑포는 군사적 요충지였다. 적성積城이라는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까운 곳에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성이 곳곳에 남아있다.
고구려 3대 성城 중의 하나인 호로고루는 고랑포 여울목 바로 위에 자리하고 있다. 삼국시대에도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였고, 뺏고 뺏기면서 주인이 바뀌었다.
임진강 하류는 수심이 깊어 배를 이용하지 않고는 강을 건널 수 없으나 호로고루 부근은 무릎이 겨우 잠길 정도였다. 대규모 병력을 육로로 이용할 경우 개성에서 한성으로 가는 가장 짧은 거리상의 요충지여서 한국전쟁 당시 싸움이 가장 치열했던 곳으로 탱크를 밀고 내려오는 중공군과 맞서 싸우느라 2천여 명의 병사들이 전사했다.
젊은 목숨은 나라를 지키느라 꽃잎처럼 스러져 임진강을 피로 물들였다. 우리는 지금 그들이 흘린 피의 값으로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여기서 3킬로만 가면 북한이고 앞에 보이는 산은 비무장 지대이다. 1968년 세상을 놀라게 했던 1,21 사태 때에 서른한 명의 북한 특수부대원들은 청와대와 미대사관 폭파의 임무를 띠고 바로 저 산을 넘어와 이곳 고랑포 여울목을 건너 서울로 침투를 했다.

임진강에 새겨진 역사
임진강 일대는 흐르는 물굽이마다 수많은 역사와 한이 서려 있다. 조선이 개국한지 200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선조는 조정을 버리고 4월 그믐 칠흑 같은 밤 임진강을 건너 몽진을 갔고, 일 년 반 만에 다시 임진나루에 돌아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순국한 병사들의 넋을 달래는 위령제를 지냈다. 의주로 피난 당시 비바람속에 나루를 건너게 된 쓰라린 아픔과 이 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린 병사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가운데 선조는 통곡하며 “하느님 도움을 받아 이 나루터를 다시 돌아오게 되었구나” 하여 고구려 때 지명인 신지강神智江이 임진강臨津江으로 개칭 되었다 한다.
정면에 가로막힌 산, 구불구불 보이는 길을 따라가면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릉敬順王陵이 있다. 건국 992년간 이어온 신라를, 국가 기능이 마비되자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 경순왕은 서라벌에서 개성까지 찾아가 나라를 고려 태조에게 넘겨주었다.
임진강 변 남쪽 솟아오른 봉우리에 영수암永守庵이란 암자를 짓고 태조의 딸 낙랑공주와 결혼하여 아들·딸 낳고 살면서도 서라벌을 못 잊어 경주방면을 바라보며 눈물지었다 한다. 귀부한지 43년 만에 세상을 떠난 경순왕, 비보를 접한 신라 유민들이 장사진을 이루어 경주에 장례를 모시고자 하였다. 경순왕도 서라벌에 묻히고 싶었으리라. 그러나 고려 조정은 경주로 가는 도중 민란民亂이 일어날까 두려워 ‘왕의 구柩는 백리 밖을 나갈 수 없다.’ 하여 고랑포를 넘지 못하였다.
경순왕은 암자 이름을 왜 영수암永守庵이라 했을까. ‘이곳은 영원히 지켜야 한다.’ 신라를 지키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이 나라의 허리인 이곳을 꼭 지키라는 간곡한 당부였는지 모른다.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물길로
천 년 전에는 경순왕이 남쪽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고, 지금은 실향민이 북쪽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린다. 총성은 멎었으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기 저렇게 아름다운 능선은 갈 수 없는 곳이다.
사람들이 갈라놓은 터에 나무와 꽃, 새와 곤충, 동물들은 먼저 통일을 이루어 자유를 만끽한다. 더 나아갈 수 없어 황포돛배는 떠나온 곳을 향해 뱃머리를 돌린다. 조금 전까지 흥에 겨웠던 승객들은 임진강의 슬픈 사연과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애절한 곡조에 숙연해진다.
자연은 한 번도 분단된 적이 없고, 임진강은 남과 북을 나눈 적이 없으나 인간들은 분열과 대립으로 담을 쌓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쌓은 벽은 사람들에 의해 헐리게 되어 있다. 동·서로 높이 쌓아 올린 베를린 장벽이 순식간에 무너졌듯이, 남과 북의 경계도 무너져 내리는 날이 있으리라. 상처 난 허리를 친친 감은 임진강은 오늘도 그날을 기다리며 황포돛배를 띄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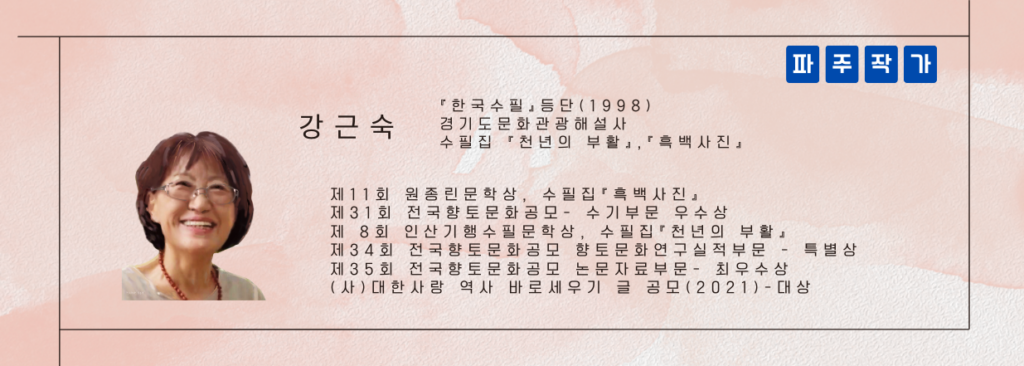


One response
!강작가의 글이 너무 맛깔스럽습니다. 단숨에 읽어내려갔습니다.!
2억년전부터 몇십년전까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표현하셨어요. 특히 천여년전의 신라 고려역사가 바로 어제의 일처럼 생생히 떠오르게 합니다.
재미있게 앍었습니다.